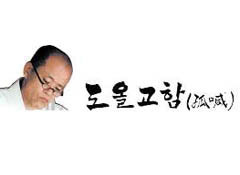교육
[도올고함(孤喊)] 누가 대학을 타락시켰나
소나무^^
2007. 7. 11. 12:50
[중앙일보] 나 도올은 평생을 교육에 헌신해 온 사람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대학에 관해 이야기하라면 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발견키 어렵다. 1986년에 양심선언을 발표하고 대학강단을 떠났다고는 하지만 나는 이미 37세에 유수 대학 정교수가 된 사람이요, 65년 고교를 졸업한 후로 천하의 명문을 다 거쳤고 오늘날까지 대학 캠퍼스와의 인연을 버린 적이 없다.
그런데 내 평생 일찍이 대학을 바라보며 이토록 참담한 심정에 젖어본 적이 없다. 관자(管子)는 수인(樹人)이야말로 백년지계(百年之計)라 했고, 일 년에 한 번 수확하는 곡식과는 달리, 한 번 심어 백 번을 수확하는 것(一樹百穫)이 교육이라 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본질적으로 왜곡된 길을 걸어왔다. 국운(國運)의 경위(傾危)를 통감(痛感)한다. 나 중앙일보에 투신한지도 어언 백 일, 백일해를 앓는 통절한 가슴으로 포효하노라.
교육이란 원칙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위인(爲人)의 목표가 명료해야 한다. 중세기의 교육은 훌륭한 성직자(priest)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이다. 조선왕조의 교육은 출중한 선비(士.scholar-administrator)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이다. 그러나 현금의 교육은 성직자를 기르기 위함도 아니요, 선비를 기르기 위함도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르기 위함인가? 그 대답은 명료하다. 우리는 근대 시민사회에 살고 있다. 시민사회의 교육이란 위대한 시민(citizen)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시민은 태생의 청탁수박(淸濁秀薄)은 다를지라도 그 본성의 존엄함에 있어서 동일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며, 현실태의 우열은 있을지라도 평등주의적 인간관의 원칙(egalitarian ideal)에 의하여 교육돼야 할 권리를 소유한다.
교육부의 삼불(三不)정책 중 본고사 문제와 기여입학제는 방법상의 문제이므로 시의(時宜)에 따라 협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으나 고교등급제 불허의 원칙은 평등주의적 이상의 시각에서 볼 때 수용될 수 있는 여헌(慮憲)이다. 고교등급제를 인정한다는 것은 대학졸업자에게 투표용지를 두 장 주어야 한다는 주장과 별 다름이 없다. 어떻게 견문과 품격의 차이가 그토록 상이한 남녀노소에게 차별 없이 최고통치자를 뽑는 막강한 권리를 동일하게 허용한단 말인가? 그러나 그러한 아이러니가 바로 시민사회의 출발이요 원칙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새로운 신분세습제를 인정하는 시세의 역행이 되고 말 수도 있다. 고교평준화만 합리적으로 운영되어도 '기회균등할당제'니 뭐니 하는 무리한 정책이 강요될 필요가 없다. 그러한 할당제는 오히려 지방의 인재를 서울로 몰리게만 할 뿐이요, 대학 간의 서열을 고착시키는 불균형의 정책이 되고 만다. 교육부 정책에 일관된 철학이 결여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 왜 이토록 상식이 망각되는 사회가 되었느뇨? 그 고질(痼疾)의 원흉이 바로 대학이다. 몇몇 엘리티즘의 본산을 자처하는 서울의 대학들이 우수한 학생을 뽑는다는 생각에만 몰입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의 학부를 없애야 한다는 것은 만인의 간망(懇望)이요, 지각자의 소망이지만 기득권자들의 안일한 타성 때문에 혁파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다.
왜 기러기 아빠들이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는가? 이유인 즉 단순하다. 그들의 자녀들이 불필요하게 치열한 경쟁구조 속에서 희생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외국에서는 그러한 경쟁구조가 없어도 너그러운 교육의 혜택이 상존한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학교육 운운하면 반드시 선진국 타령하면서 타국의 예를 들지만, 모든 선진교육의 본질이 우수한 학생을 뽑는 데 있지 아니하고, 우수한 학생으로 길러내는 데 있다는 기초적 사실은 망각해 버린다. 하버드가 좋은 대학이라면 그것은 입학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좋은 교육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젊음이란 가능태일 뿐이다. 한 시점에서의 한 기준이란 위인의 준칙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왜 이토록 대학이 타락하였는가? 바로 교육부가 대학을 타락시켜왔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라니 뭔 얼어빠진 '인적 자원'이냐? 그들은 인간을 산업사회의 휴먼 리소스로서만 파악하고 인간을 철저히 등급화시키고 효율성의 제물로 만드는 데만 광분하여 왔다. 학부제를 강요하여 학문 간의 서열을 조장하고, 대학 평가를 통하여 교육의 본질을 외형적 조건에 부속시켰고, BK 따위의 당근으로 부당한 채찍을 가하여 대학인들의 일체감을 파괴시켰고, 학문의 특수성을 말살시켰다. 어찌할꼬! 어찌할꼬! 교육부와 대학이 같이 책임져라! 깨달을지어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성인의 탐욕이 빚어내는 인간 서열화를 결코 반가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만큼 가치관이 다양하고, 색다른 저력을 과시하고 있나니.
그런데 내 평생 일찍이 대학을 바라보며 이토록 참담한 심정에 젖어본 적이 없다. 관자(管子)는 수인(樹人)이야말로 백년지계(百年之計)라 했고, 일 년에 한 번 수확하는 곡식과는 달리, 한 번 심어 백 번을 수확하는 것(一樹百穫)이 교육이라 했다.
|
교육이란 원칙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위인(爲人)의 목표가 명료해야 한다. 중세기의 교육은 훌륭한 성직자(priest)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이다. 조선왕조의 교육은 출중한 선비(士.scholar-administrator)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이다. 그러나 현금의 교육은 성직자를 기르기 위함도 아니요, 선비를 기르기 위함도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르기 위함인가? 그 대답은 명료하다. 우리는 근대 시민사회에 살고 있다. 시민사회의 교육이란 위대한 시민(citizen)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시민은 태생의 청탁수박(淸濁秀薄)은 다를지라도 그 본성의 존엄함에 있어서 동일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며, 현실태의 우열은 있을지라도 평등주의적 인간관의 원칙(egalitarian ideal)에 의하여 교육돼야 할 권리를 소유한다.
교육부의 삼불(三不)정책 중 본고사 문제와 기여입학제는 방법상의 문제이므로 시의(時宜)에 따라 협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으나 고교등급제 불허의 원칙은 평등주의적 이상의 시각에서 볼 때 수용될 수 있는 여헌(慮憲)이다. 고교등급제를 인정한다는 것은 대학졸업자에게 투표용지를 두 장 주어야 한다는 주장과 별 다름이 없다. 어떻게 견문과 품격의 차이가 그토록 상이한 남녀노소에게 차별 없이 최고통치자를 뽑는 막강한 권리를 동일하게 허용한단 말인가? 그러나 그러한 아이러니가 바로 시민사회의 출발이요 원칙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새로운 신분세습제를 인정하는 시세의 역행이 되고 말 수도 있다. 고교평준화만 합리적으로 운영되어도 '기회균등할당제'니 뭐니 하는 무리한 정책이 강요될 필요가 없다. 그러한 할당제는 오히려 지방의 인재를 서울로 몰리게만 할 뿐이요, 대학 간의 서열을 고착시키는 불균형의 정책이 되고 만다. 교육부 정책에 일관된 철학이 결여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 왜 이토록 상식이 망각되는 사회가 되었느뇨? 그 고질(痼疾)의 원흉이 바로 대학이다. 몇몇 엘리티즘의 본산을 자처하는 서울의 대학들이 우수한 학생을 뽑는다는 생각에만 몰입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의 학부를 없애야 한다는 것은 만인의 간망(懇望)이요, 지각자의 소망이지만 기득권자들의 안일한 타성 때문에 혁파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다.
왜 기러기 아빠들이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는가? 이유인 즉 단순하다. 그들의 자녀들이 불필요하게 치열한 경쟁구조 속에서 희생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외국에서는 그러한 경쟁구조가 없어도 너그러운 교육의 혜택이 상존한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학교육 운운하면 반드시 선진국 타령하면서 타국의 예를 들지만, 모든 선진교육의 본질이 우수한 학생을 뽑는 데 있지 아니하고, 우수한 학생으로 길러내는 데 있다는 기초적 사실은 망각해 버린다. 하버드가 좋은 대학이라면 그것은 입학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좋은 교육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젊음이란 가능태일 뿐이다. 한 시점에서의 한 기준이란 위인의 준칙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왜 이토록 대학이 타락하였는가? 바로 교육부가 대학을 타락시켜왔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라니 뭔 얼어빠진 '인적 자원'이냐? 그들은 인간을 산업사회의 휴먼 리소스로서만 파악하고 인간을 철저히 등급화시키고 효율성의 제물로 만드는 데만 광분하여 왔다. 학부제를 강요하여 학문 간의 서열을 조장하고, 대학 평가를 통하여 교육의 본질을 외형적 조건에 부속시켰고, BK 따위의 당근으로 부당한 채찍을 가하여 대학인들의 일체감을 파괴시켰고, 학문의 특수성을 말살시켰다. 어찌할꼬! 어찌할꼬! 교육부와 대학이 같이 책임져라! 깨달을지어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성인의 탐욕이 빚어내는 인간 서열화를 결코 반가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만큼 가치관이 다양하고, 색다른 저력을 과시하고 있나니.